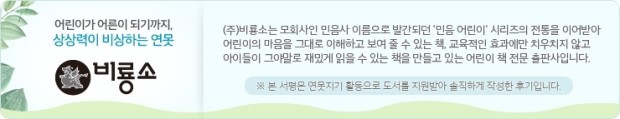휴일에 가끔 보게 되는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서 최근 반복해서 보게 되었던 영화가 있다. 바로 <아빠는 딸>. 워낙 한국 영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데다 몸이 서로 바뀐다는, 약간은 고리타분한 설정에 ‘나는 절대로 저 영화는 보지 않겠구나…’ 생각했다. 그러다 비룡소의 청소년 브랜드 까멜레옹의 책 <아빠와 딸의 7일간>이라는 제목을 보니 감이 딱 왔다. 이 소설이 원작이구나… 하고. 영화도 그렇고 책 표지도 그렇고 무척 한국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일본 작가의 작품이다.
영화에 대한 설명을 보았기 때문인지 처음 소설 도입 부분이 영 지루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왠지 그 다음 내용도 알 것 같았고 작가가 이 작품을 왜 썼는지도 알겠고 딱히 새로울 것이 전혀 없었다고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소설을 줄줄 읽고 있었고 나름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감탄하고 마지막엔 감동하기까지 했다. 어쩌면 뻔한 결말에 만들어진 감동일지 몰라도 그걸 다 아는데도 눈물짓게 하는 작가의 힘은 칭찬할 만하다. 마지막 장을 덮고 생각해 본다. 분명 다 아는 내용이었고 결말까지 예측했는데 나는 왜 감동 받고 있는 건지.
작가는 호러서스펜스 대상을 수상하며 작가로 데뷔했다고 한다. <아빠와 딸의 7일간>도 몸이 바뀐다는 설정이 어떻게 보면 무섭고 끔찍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을 다른 스위치 작품들처럼 때론 코믹하게, 때론 진지하게 풀어냈지만 기본적으로 작가는 사람의 심리를 잘 묘사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읽어나가며 가장 많이 생각했던 건 남편에게도 이 책을 읽혀야겠다…라는 것이었다. 딸아이가 사춘기에 들어서며 나와는 다르게 자주 부딪치는 경우가 많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자주 했기 때문이다. <아빠와 딸의 7일간> 속 아빠와 딸도 그렇다.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지 정확하게 생각도 못하는 사이 아빠 교이치로와 딸 고우메는 대화 한 마디 하지 않고 지낸지 오래이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두 사람의 몸이 바뀌고 아빠는 고등학생 딸로, 딸은 샐러리맨 아빠로 일주일을 살게 된다. 평소 대화를 하지 않았으니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상황을 잘 헤쳐가기 위해 이 둘은 몇 년간 하지 않던 대화를 하게 되고 서로의 생활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아마도 내가 어느 정도의 내용을 알면서도 이 소설에 푹 빠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두 사람의 심리 묘사 때문이었을 것이다. 너무나 생생한 사춘기 딸의 상황과 정말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샐러리맨의 하루하루가 너무나 생생히 묘사되기 때문이다.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인간 관계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방법인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소홀해질 때가 있다. 아니면 당연히 이해해주겠지…하고 말이다. 하지만 그런 오해들이 쌓이고 쌓여 단절을 만들어낸다. <아빠와 딸의 7일간>은 어느 한 쪽이 옳다거나 어느 한 쪽의 상황만을 이해해달라고 하지 않는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주는 세대차이와 각자의 위치를 설명하고 조금씩만 이해하고 들여다보자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다시 각자의 위치로! 그래서 의미있는 소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