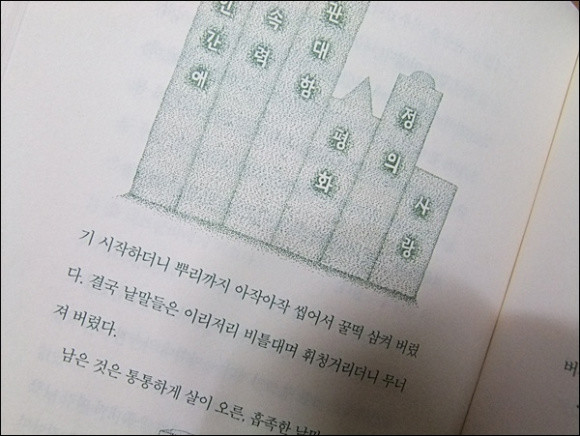노벨 문학상 작가의 자전적 어린시절 이야기 / 별이 된 소년
아동 시 를 만날때면 어떻게 이리 순순한 눈을 가질 수 있을까?
문학적 시 를 만날때면 어떻게 이런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
아름다운 시 를 만날때면 세상은 이리도 행복한 거였었구나 ! 절로 그 감정들에 몰입되어 갑니다.
문학이란 장르가 원래 그러하지만 특히나 짧은 축약된 언어로 표현하는 시의 세상은 사람들의 감정을 그러게 좌지우지 하네요. 그 시를 지금까지 보기도 했었고 써 보기도 했었는데 여기, 또 하나의 다른 시가 있었습니다. 시인의 감성을 만들어지는 이야기, 시를 쓰기위해 필요한 의지를 다져가는 시였습니다.
파블로 네루다라고 하는 칠레 시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1971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시인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던 어린시절만큼이나 그의 평생은 순탄치가 않았었다라고도 하는데 그 시인의 어릴적 모습을 그린 자전적 소설이 바로 비룡소 걸작선 19번째 별이 된 소년이었습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년의 9살 모습으로 시작하여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으니 성장소설이라 해야 할터인데 그 보다는 시인이라는 단어의 감성과 작업에 대해 더욱 깊게 다가가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얼마전 아이들과 함께 문학작품이자 영화의 고전인 닥터지바고를 뮤지컬로 보았었답니다. 화려한 무대와 의상 노래와 연기등 볼거리가 풍성한 여타의 뮤지컬과는 좀 더 다른 색깔로, 소련 혁명기의 복잡한 현실에서 한 남자의 사랑과 고뇌를 그린 작품을 아이들은 어떤식으로 받아들일까 걱정이 많았었건만 아이들은 아이들만의 식으로 받아들이더군요. 그로부터 얼마되지 않아 마주한 별이 된 소년은 내용적으로 문학성적으로 자꾸만 그 둘이 교차해가고 있었습니다.
닥터지바고속의 지바고가 사회혁명과 1차대전이라는 상황에 맞서 시를 썼다면, 파블로 네루다는 완고하면서 마초와 같은 아버지와 독단적이면서도 폐쇄적인 사회와 국가에 맞서 노동자를 위한 시를 쓴 시인이었지요
폭군과 같은 아버지는 가족 모두를 공포에 밀어넣기 일수요, 자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엔 아무 관심도 없으며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직업,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을 갖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참으로 아이러니 한것은 자신의 체면을 가장 중요시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표현이 잘못되어 있던 것일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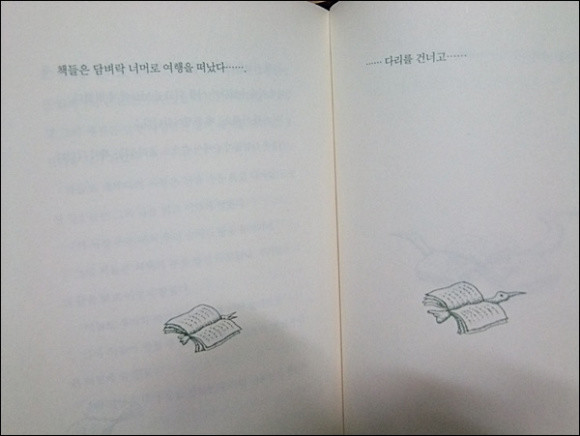
뼈와 가죽만이 있었던 빼빼마른 소년은 몸이 약하다라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갖은 멸시를 당하면서 읽고 싶은 책은 몰래 봐야만했고 , 자신의 관심품들 또한 아버지 몰래 수집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은 13살 어린나이에 이미 시를 기고할만큼 용기와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어 더 커서는 많은 사람들의 감성을 쥐고 흔드는 힘이 있는 시를 쓰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대도시의 익명성 속에서 그의 글씌는 날씨처럼 끈질겼다. 시가 제 길을 놓았고 그는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글을 썼다. 코딱지만 한 방에서 살 때도, 먹을 것을 살 돈이 거의 다 떨어지고 ….. 친구 하나 없이 자기 안에 깊이 빠져들 때도
그의 시가 농부의 손에 들어가면 ” 이 사람 손은 마치 우리 손처럼 땅을 움직이네 “
빵집 주인에게 읽혀지면 ‘ 이 사람은 내가 빵을 만들면서 어떤 기분인지 아는구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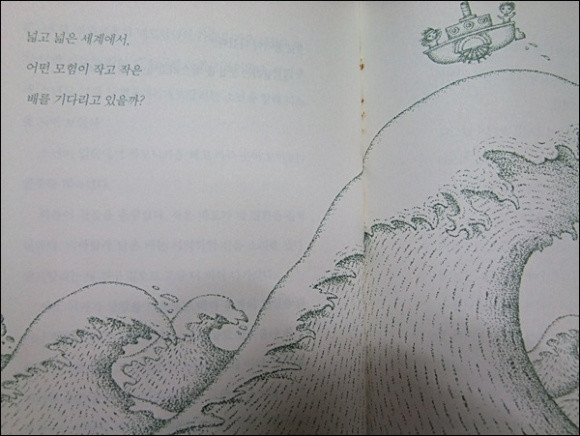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시인의 어린시절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전적 이야기가 아니라, 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억압을 당하면 당할수록 꺽이기보단 더욱 숭고해지는 어린시절의 꿈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결, 원주민과 이주민의 대결, 노동자와 부르조아의 대결,등 다양한 모습들 속에서 시라고 하는 매개체가 이루어낸 작가의 꿈과 이상,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문학의 힘이었습니다.
진중함속에서 감동을 주는 이야기, 그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꿈이 꺽이려할때마다 새로운 힘이 되어줄 의지와 원천을 보았으니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장소설이구나 싶네요